2020. 4. 16. 15:25ㆍ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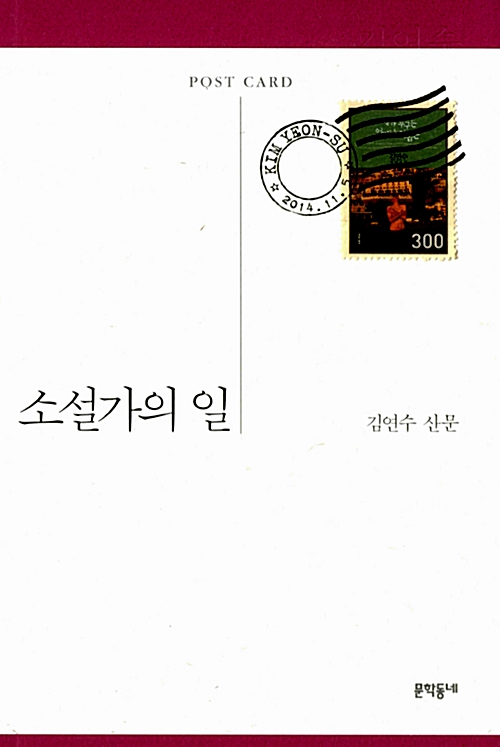
※ 개인적인 성향의 일기 같은 리뷰입니다.
나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어쩌다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쓰는 글을 남들이 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쓰고 싶어 졌다. 이왕 쓰는 거.
그동안 많은 책을 읽어 왔지만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찾아서 본 적은 없었다. 나름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해왔고 설탕 독서는 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데 말이다. 몇 년 전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이나 공감 필법 정도를 읽었던 적이 있지만, 그건 글을 잘 쓰고 싶어서라기보다 내가 유시민 작가의 책이라면 출간하는 족족 모두 읽는 독자였기 때문이다. 근데 저 책들도 다시 읽어보려고. 그때는 매일 쓰는 글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 쓰고 나 혼자 볼 일기 쓰는 게 전부라 굳이 남이 공감할만한 양질의 글을 쓸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니까. 예전과는 꽤나 다르게 다가오려나.
그래서 난 무려 "소설가의 일"을 읽었다. 김연수 작가의 산문집이다. 작가들이 쓰는 에세이는 은근히 묘한 매력을 준다. 김연수 작가의 또래보다 그 윗 세대의 작가들이 특히 그렇다. 에세이 속에 꽤나 솔직하게 본인을 드러낸다. 독자인 내가 '응?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응? 정치 성향까지 밝히는 거야?' 따위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달까. 오히려 읽는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는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야 하나.
물론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고. 그냥 궁금했다. 글을 잘 쓰고 싶어 지니까, 그럼 글은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걸까. 어떻게 소설이 쓰이는 걸까? 하는 것들. 블로그 하나 시작했다고 전혀 내 분야가 아닌 것에.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내가 재밌다. 혹자는 시작은 시작일 뿐이라고 큰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 했지만 적어도 나한테 시작은 반 이상인 것이다. 앞으로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엄청나게 읽을 것 같거든. 혹시 모르지. 허접한 습작이라도 어느 순간 겁도 없이 시작하게 될지도.
나는 빵을 만들 줄 안다. 어느 정도의 제과 제빵은 할 줄 안단 소리다. 몇 년 전 스스로 독학하였다. 나는 고기보다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는 빵 처돌이인데, 아무래도 모든 빵순이들의 종착점은 전국 방방곡곡 세계 방방곡곡 맛있는 빵들을 찾아서 먹는 거에 더 이상 새로움을 느끼지 못해서 결국엔 스스로 베이킹을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해보니 난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특히나 소설을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소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궁금해했을 법도 한데.
생각 외로 이 에세이는 무척이나 재미있었다. 피식피식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으하하 으하하하 이런 웃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다 읽고 나니 김연수 작가도 달리 보이고. 아마 난 앞으로 그의 소설을 만나게 되면 아마 '소설가의 일'을 떠올리며, 그의 소설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김연수 작가는 소설가는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선택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 코스톨라니도 투자자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래. 소설가도 날 때부터 선택되는 것이고 투자자도 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지. 잘났다 그래. 치.
나는 학부 때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였다. 타과생으로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그때 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실 때마다 굉장히 자주 꼭 "우리 심리학자들은"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셨다. 예를 들어, "우리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야 해요. 우리는 다 심리학자잖아. 우리 같은 심리학자들은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따위의 말들. 물론 그 교수님이 나같이 복수전공을 하는 타과생이 그 말로 소외감을 느낄 거라고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말을 하셨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사무쳤다고 해야 하나. 마치 나 빼고 너네들은 다 "심리학자"인데 나만 거기 못 끼는 "심리학자가 아닌 사람"인 것만 같아서. 마치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와 비슷한 느낌을 소설가의 일을 읽으면서 다시 느꼈다. 김연수 작가도 "우리 소설가들은, 우리 같은 소설 쓰는 사람들은" 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더라. 물론 소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글이니 당연히 글을 쓰는 친구들이 독자일 거라고 짐작하여서 그런 건지.(그리고 그게 사실일 거고) 소설가도 아닌 내가 이 책을 읽다 보니 괜히 또 소외되는 느낌? 그냥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요 근래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확실히 작가들은 문체가 다르다. 문장 하나하나가 다르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꼭꼭 짚어가며 보게 되는 것이다. 문장은 섬세하고 어휘도 하나하나 남다르니까. 그래서 소설 가려나.
김연수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핍진성"이다. 소설에서의 핍진성이란 "소설에서 진실, 반박할 부분이 한 곳도 없는 완벽한 이야기." 란다. 있음 직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것. 현실에서 동떨어지고 개연성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공감을 불어 일으키고 실제로 일어날법한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
김연수 작가는 소설을 쓰는 것을 인생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였다.
난 그게 좋더라.
원래 잘나고, 원래 다 가진, 부족함 없는 캐릭터는 매력이 없다. 우리는 항상 역경과 고난을 겪고 성장한 캐릭터를 사랑한다. 20여 년 전에 방송했던 청춘드라마 "프렌즈"에서 레이철을 연기한 제니퍼 애니스톤이 미국인들의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 아메리칸 스윗허트까지 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고생 안 하고 곱게 자란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결혼식에서 도망쳐버렸다.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후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엔 원하던 패션업계에서 일하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었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철부지 아가씨가 럭셔리 브랜드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멋지게 성장했는데! 만약 레이철이 결혼식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예정대로 치과 의사와 결혼하여 의사 사모님이 되었어도 레이철이 그렇게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 있었을까? 난 아니었을 거라고 본다.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봐도 메이크업 전 후가 크게 다른 사람 영상을 더 보고 싶고, 항상 날씬했던 사람이 어떻게 체중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몸무게를 크게 감량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것처럼. 원래가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것처럼. 우린 그런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낀다.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완벽한 캐릭터는 주인공이 아니다. 될 수 없다. 독자들은 주인공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하고 독자들은 부족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며 고난을 극복해나가는 캐릭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항상 결핍이 있는 데다가 세상의 온갖 풍파와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주인공인 것이다. 그걸 보는 독자들은 주인공에게 온전히 감정 이입하여 내 일처럼 응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온갖 모진 일들을 겪고 어떻게 극복하여 종국에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나도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되고 싶다. 만약 내 인생이 소설책이라면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독자들이 나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해버려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서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소설책 말이다.
그러니 좌절도 좋은 것이다. 고난도 좋은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소설은 밋밋하다. 인생도 밋밋하다.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 모양이다. 감히 좌절과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다니.
내가 초록지붕 집에 사는 Ann뒤에 e가 붙은 앤을 사랑하는 이유도, 작은 아씨들의 진취적인 조를 사랑하는 이유도, 오만과 편견의 뻔하지 않은 엘리자베스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캐릭터들은 전부 오래 보아야 예쁘다. 처음엔 하나도 예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싫기까지 하다. 못났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하지만 종국엔 이들과 깊은 사랑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출간된 지 몇백 년이 흘렀어도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이들이 시대를 뛰어넘는 매력이 있다는 것이겠지!
마지막으로 '소설가의 일'에서 내가 크게 공감하였던 문단을 소개해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나 싶다. 세상 전부인 사람과도 다투는걸. 하물며 타인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난 감히 이해까지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려 한다.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그랬구나." 하고. 하지만, 소설가는 타인의 삶을 쓰는 자들이니 당연히 타인도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하겠지만 김연수 작가의 말대로 설사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은 것이다. 100에서 감히 0.1만 이해하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가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하려고, 가 닿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타인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건 우리의 노력과는 무관한 일이다. 하지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장이 쓰이냐는 것이다.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나도 회사 다니는 동안 책 한 권 써볼까? 리뷰 (29) | 2020.04.19 |
|---|---|
|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리뷰 (57) | 2020.04.17 |
| 그렇게 나는 스스로 기업이 되었다 리뷰 (33) | 2020.04.12 |
|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리뷰 (84) | 2020.04.09 |
| 소설 "티파니에서 아침을(Breakfast at Tiffany's)" 리뷰 (27) | 2020.04.09 |